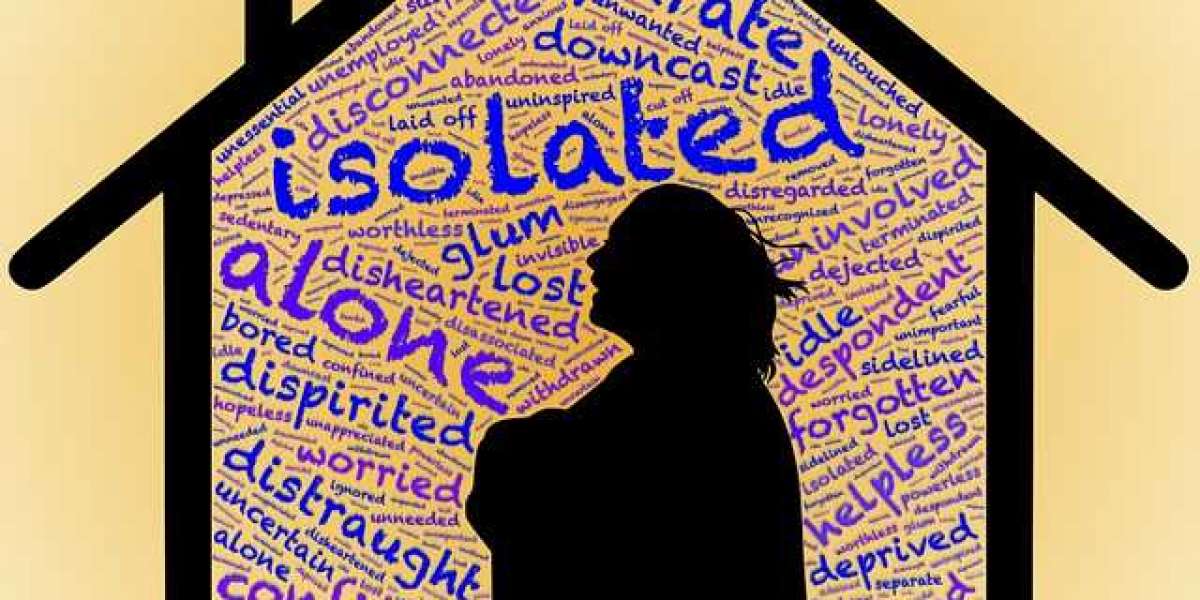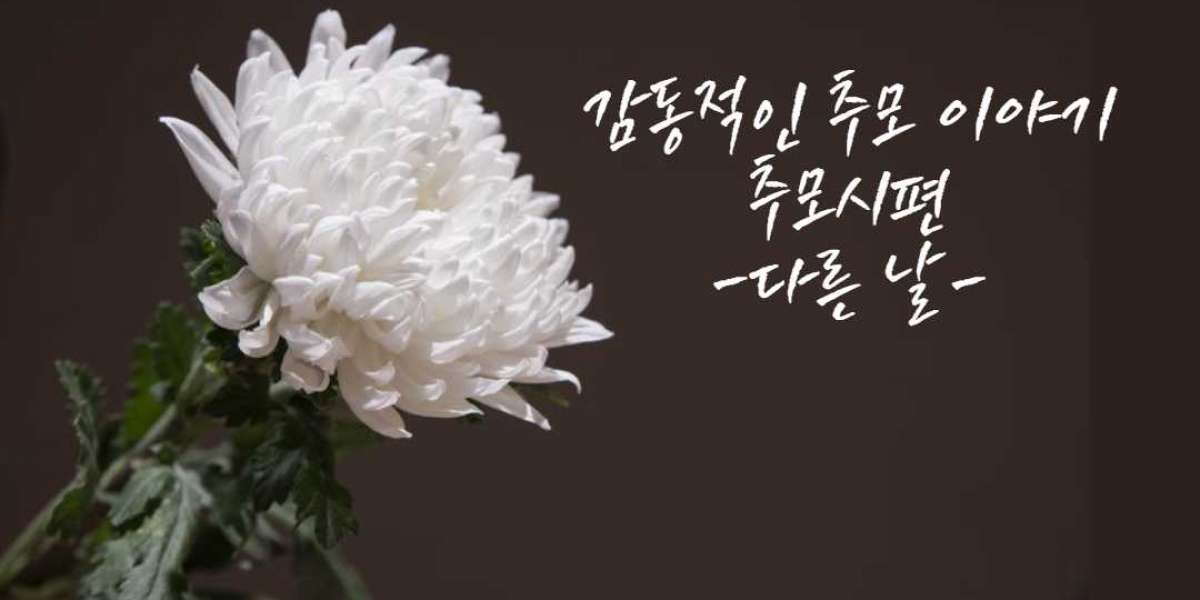대인관계 단절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했고, 연말에도 즐거운 송년회를 위해 모임의 시간을 정하는 등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되었으나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하게 되면, 친구들과 만나 함께 웃고 떠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해도 일부러 피하거나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로 더 이상 깊은 대화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만나 웃으며 이야기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는 상실을 경험한 유족으로서 모임에서 웃고 떠드는 자신을 지인들이 무엇이라 생각할지, 특히, ‘자녀를 잃은지 얼마 되었다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부모를 잃은 사람 같지 않게 너무 밝네’라는 등의 이야기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모임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고인의 사망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두려워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족은 상실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때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한 유족에게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의 감소 및 증가
상실을 경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에너지가 급상승하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국가 정책의 잘못된 방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을 희생해 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고등학생 딸을 떠나보낸 한 아버지는 가족의 무관심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적 지상주의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누군가 또 희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국가를 상대로 교육 정책을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거나, 교육 관련 정부 부처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러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죽은 딸이 돌아올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족은 상실을 경험함과 동시에 외부 활동이 증가하기도 하며, 단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경험하기도 합니다.

1. 영리적 목적의 사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2. 저작물에 적용된 디자인의 무단변경을 금지합니다.
3. 본 기관의 저작물의 활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활용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본 저작물에 실린 그림, 사진, 기타 자료를 포함한 제반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