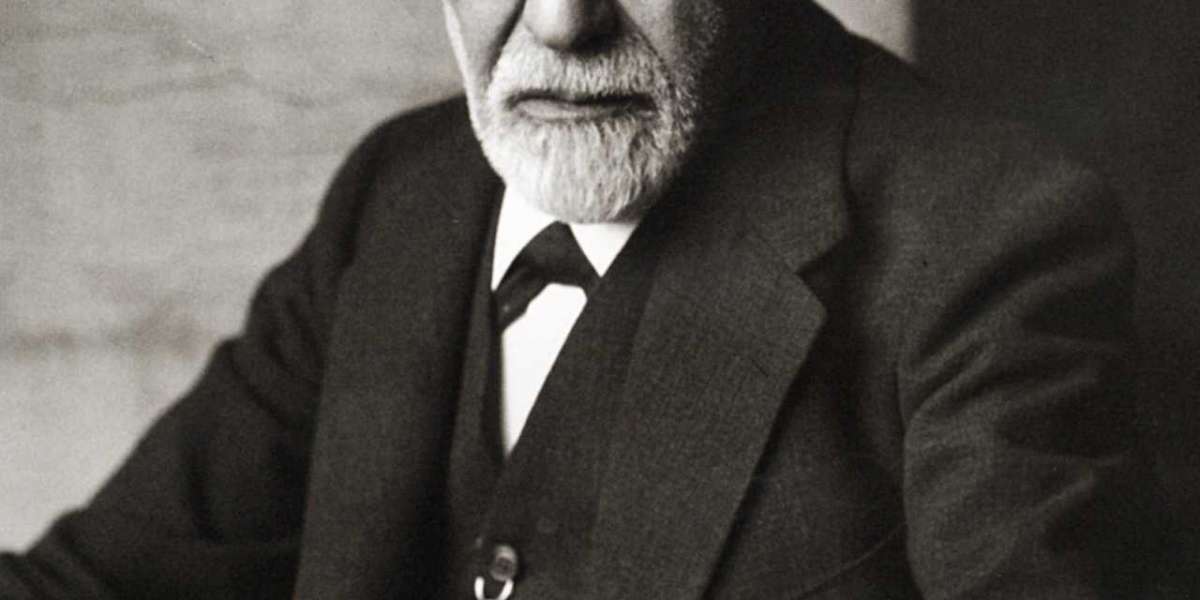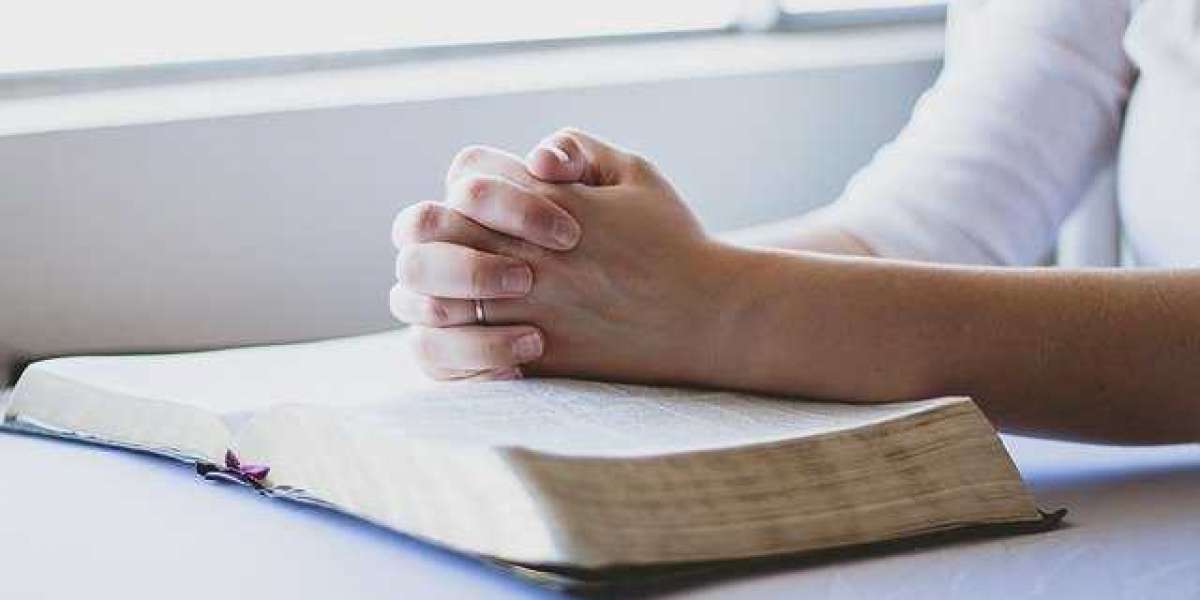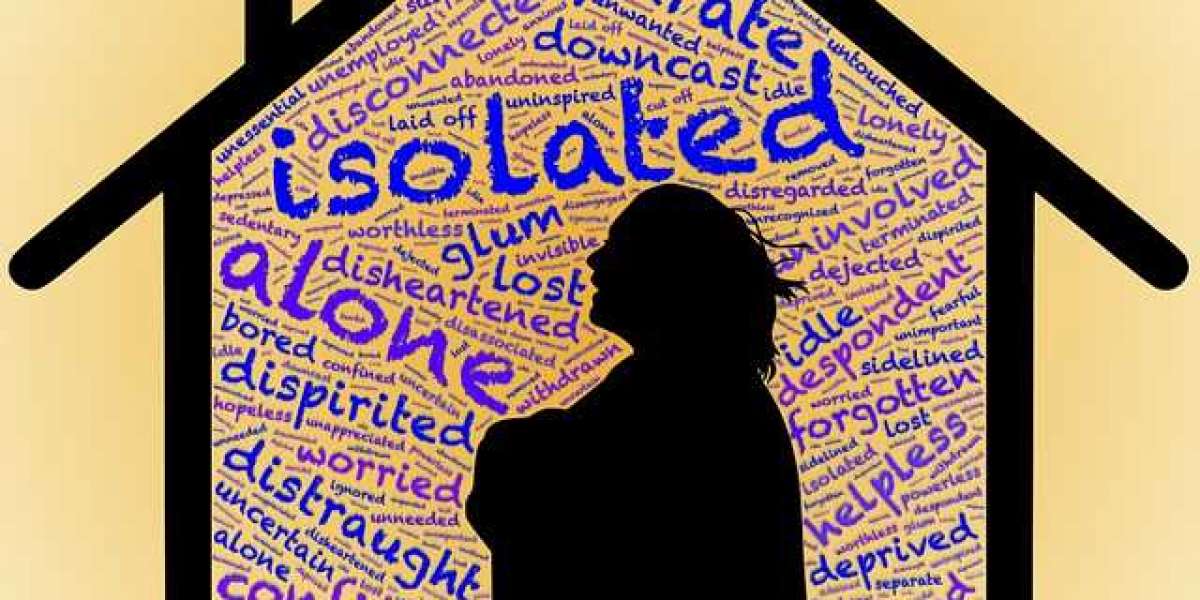애도에 관한 이론
01 정신분석 이론
사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프로이드(Freud)의 ‘애도와 멜랑콜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별한 사람이 고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생각과 느낌, 정신적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애도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적극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데, 프로이드는 이 과정을 ‘애도작업’이라고 명명
했습니다.‘애도작업’에서는 상실과 관련된 기억·생각에 직면하여 죽은 사람과의 유대를 끊고, 정신적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데 중점을 둡니다.병리적인 애도는 ‘애도작업’을 회피하거나 고인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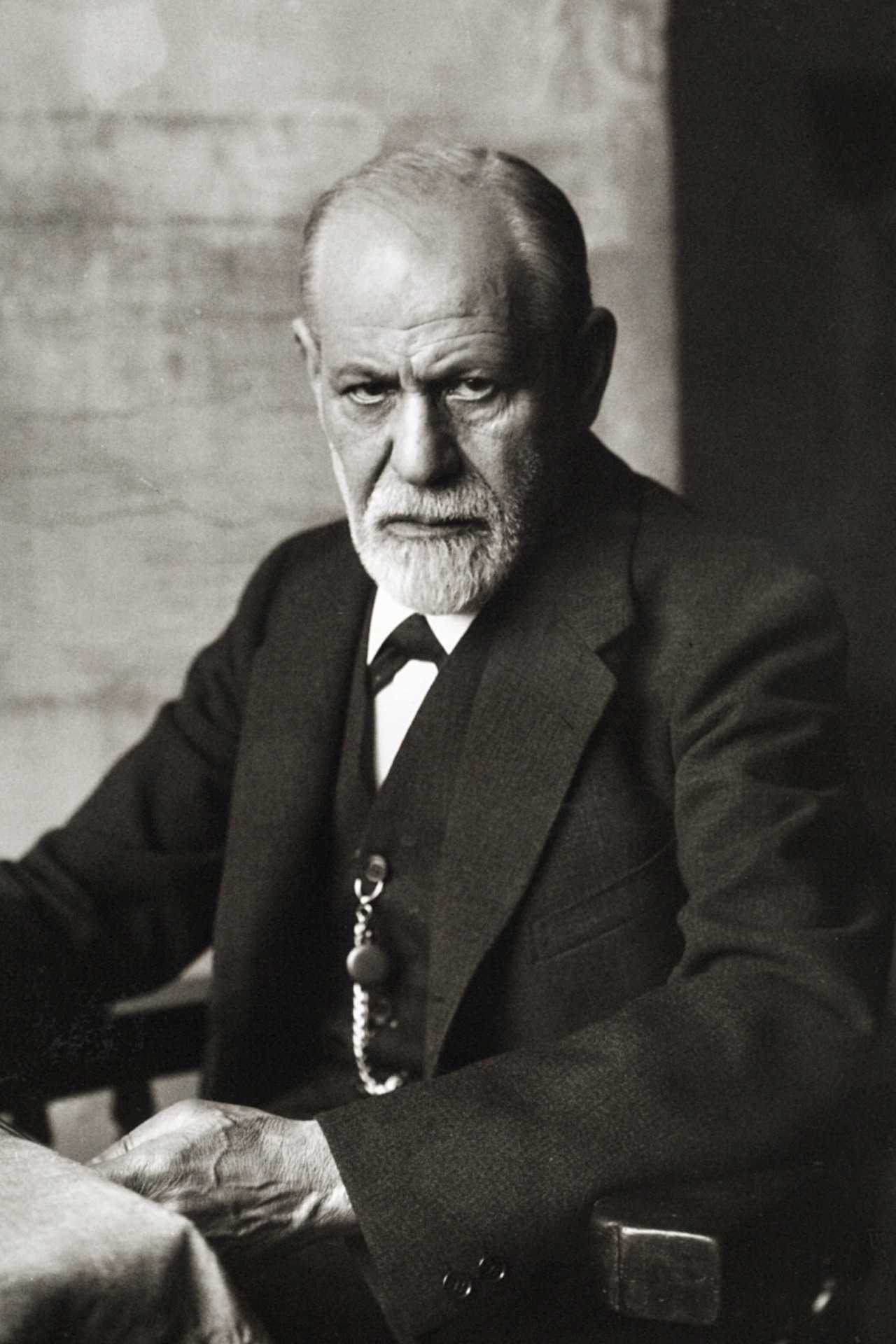
02 애착 이론
존 볼비(John Bowlby)는 엄마와 떨어졌을 때의 아동의 반응을 토대로 한 애착이론을 상실과 애도 반응에 접목시켜 적용하였습니다.볼비는 아동이 애착인물과 분리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으로 저항, 절망, 거리두기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습니다.
| 저항 | 아동이 애착 인물과 분리 시 처음 보이는 반응으로, 울고 매달리거나 엄마를 부르며 찾아 헤매는 행동을 보임. |
| 절망 | 분리가 오래 지속 되면 저항 반응이 약화 되며 불안과 분노가 커지며, 절망으로 이어짐. |
| 거리두기 | 회복이 나타나며 점차 다른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흥미를 보임. 애착 유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 사라진 애착 인물과 관련된 정서와 사고를 억제하는 단계. |
03 인지과정 모델
놀란 혹스마(Nolen-Hoeksema)가 제시한 ‘반추적 대처 양식’은 고통스러운 측면에 반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부정적 평가 과정으로, 이러한 ‘반추적 대처’는 우울감의 증가와 같이 상실의 영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대처 방식이 적응이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실 이후 의미 찾기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적 평가 과정 역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적응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전통적인 애도작업에서는 슬픔을 드러내는 직면 전략을 강조해왔으며, 감정이나 사고의 회피, 부인은 부적응적인 것으로 간주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회피 전략의 긍정적 측면이 새롭게 부각 되고 있는데, 전면적인 부인은 병리적인 애도의 형태이지만 일정 수준의 회피는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지나친 직면이나 회피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대처 전략이 적응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1. 영리적 목적의 사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2. 저작물에 적용된 디자인의 무단변경을 금지합니다.
3. 본 기관의 저작물의 활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활용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본 저작물에 실린 그림, 사진, 기타 자료를 포함한 제반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