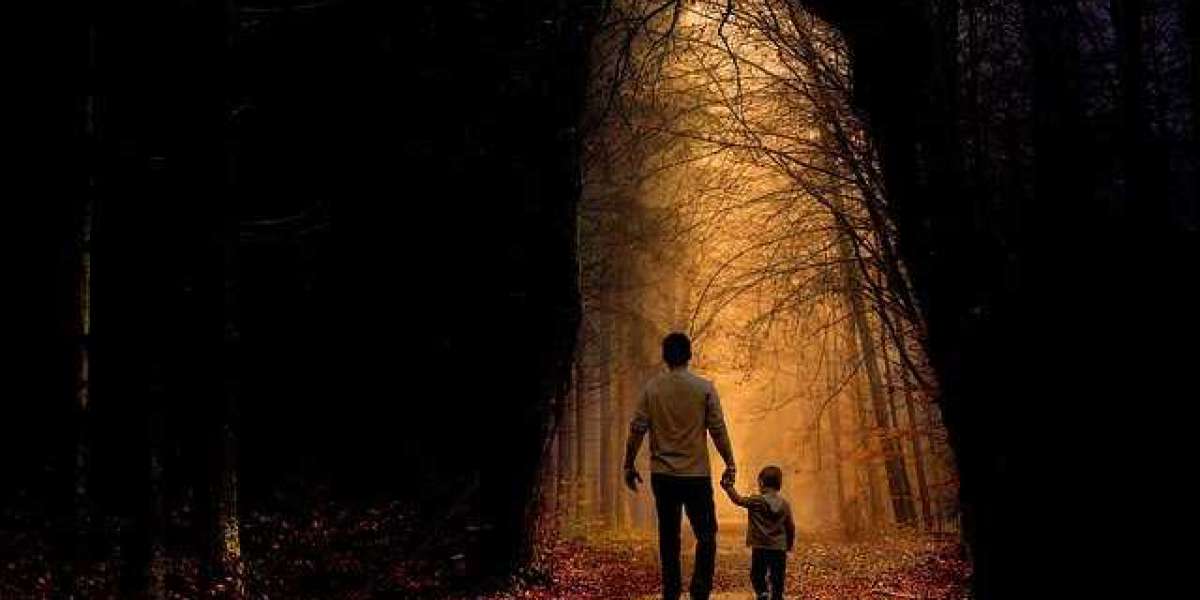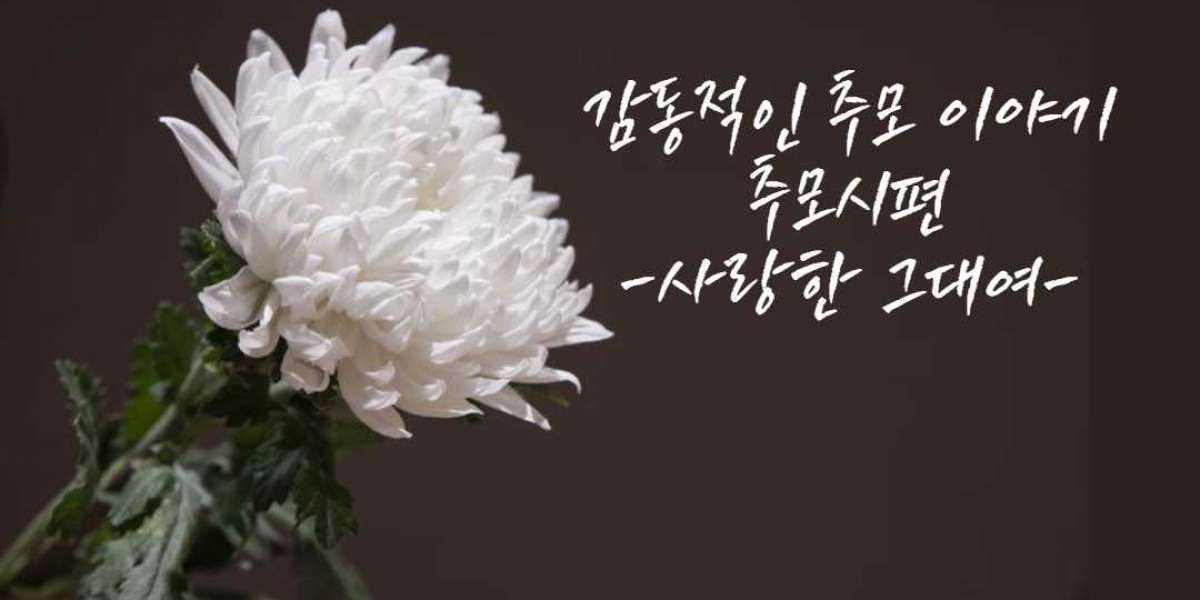아동, 청소년기에 부모를 상실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절한 애도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슬픔을 경험하는 데 있어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나이는 없습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적절한 애도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기에 발생한 상실 경험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부모가 사망했던 동일한 나이가 되었을 때 불안, 초조, 죽음 공포, 동일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많은 유족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남겨진 자녀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슬픔의 차이에 대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엄마가 많이 슬퍼하는데 저러다 엄마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없으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등 분리불안을 경험하거나 남겨진 부모도 사망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갖기도 합니다. 아동은 고인이나 죽음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슬픔이나 불안, 공포 등 여러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과격한 행동이나 건강상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는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부모 사별 후 규칙적인 수면, 식사, 외출, 대인관계 지속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건 건강한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라 일반적인 애도의 과정을 거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각 대상에게 맞는 애도 과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자녀가 성인일 때도 부모의 사망은 큰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성인 자녀 역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의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변화와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그들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죽음이나 상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는 성인 자녀는 스스로 부모의 사망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 결혼에 왜 아빠가 없어야 하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엄마의 나이가 되면서 나도 엄마처럼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 ‘엄마의 사망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건가’ 등의 생각들을 떠올리며 입학, 졸업, 결혼, 출산 등의 생애 사건들 속 부모의 부재에 대한 불만, 원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1. 영리적 목적의 사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2. 저작물에 적용된 디자인의 무단변경을 금지합니다.
3. 본 기관의 저작물의 활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활용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본 저작물에 실린 그림, 사진, 기타 자료를 포함한 제반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